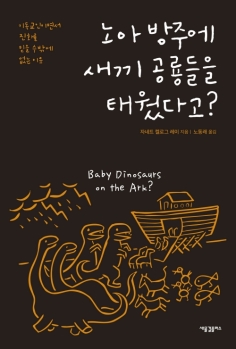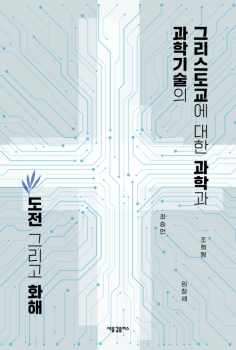지난 해 첫 번째 논문집인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발간한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다시 그만한 분량의 새로운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만유재신론이 저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현대신학에서 이 만유재신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이 과정신학자들입니다. 이들에 반대하는 것이 저의 논문의 주된 논점
입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는 말은 신학이 학문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듯이 실천과 영성, 그리고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개
혁주의신학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의 연속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
다. 만추의 계절, 저무는 석양, 유한한 인생으로 영원에 대한 감각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 119:96).
[저자서문]
지난 해 첫 번째 논문집인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발간한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다시 그만한 분량의 새로운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저는 개혁신학회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논문에 대한
논평을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김남준 목사님는 자연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날의 발표논문도 그와 관련이 있는 논문이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저를 논평자로 추천하셔서 함께 토론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 일을 맡고 있는 관계로 별반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논평자
로 참석하여 토론하면서 저는 그해 개혁신학회 가을 학회의 전체 제목이 “개혁신학과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개
혁신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시점적으로 이때를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발표한 논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논문집의 한 축인 “과학과 신학”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생 시절 철학과 학생으로서 과학철학 시간에 경험
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공 정권에 의해 해직되었다가 교수로 막 복직한 무신론자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목이었는데
저는 그 강의 시간에 강의실 한켠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과학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간단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과학에 비해 신앙은 논리적인 비약으로 가득 차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철학 시간에 실제로 들쳐본 과학 자체의 논리 구조는 그리 탄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과학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계기
는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칼빈신학교를 거쳐 풀러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낸시 머피(Nancey Murphy)라고
하는 여자 철학자 겸 신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의 세월이 지나 저는 그를 통해 다시금 대학 시절에 느꼈던
감동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관계 문제에 대한 것으로 아예 논문의 방향을 바꿀까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문학도였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과 신학에 대한 것을 저의 논문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저는 줄곧 신학적인 관심만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5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저는 뜻하지 않게
양승훈, 조덕영 박사 등과 함께 “창조론 오픈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저와 최태연 교수를 포함 6명이 공동대
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몰트만의 견해”와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맥그라스의 견해: 도
킨스의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논문은
각각 창조론 오픈 포럼 때에 발표하였던 논문들입니다.
그 중 맥그라스에 대한 논문은 『기독교신학논총』에 게재되었던 논문입니다.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시도한 하나님
의 행동에 관한 세 가지 견해”라는 논문은 제 박사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작년 2009년은 칼빈 탄생 500주년이었습니다. 여러 학회들에서 칼빈 신학의 주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전공을 말하자면 저는 칼
빈 전공자가 아닙니다. 박사논문에서 현대신학에서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토론을 조금 다루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삼위일체론도 저의 전공이 아닙니다. 물론 보다 큰 맥락에서 신론이 저의 전공이기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는 하
지만 조금은 낯선 분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쓰면서 저는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서울교회에서 6월에
있었던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행사 때 초고를 발표하였고 개혁신학회 가을 학회에서 좀더 다듬은 내용을 발표하였고
『개혁논총』에 게재하기 위해 또 다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관심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존
파이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만유재
신론이 저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현대신학에서 이 만유재신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들이 과정신학자들입니다. 이들에 반대
하는 것이 저의 논문의 주된 논점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수용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논지이
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여년 전에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용했던 방법론에 대한 것은 좀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의 결론은 너무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논문은 그렇게
해서 쓰여졌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논문을 조만간 썼으면 하는 것입니
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며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창조론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저는 존 파이퍼
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가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심대한 영향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주창하는 “기독
교 희락주의”의 요체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봄 개혁신학회의 전체주제가 웨
스트민스터신앙고백임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 희락주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칼빈의 삼위일체론 연구가 저에게 가져다 준 일종의 보너스와도 같은 것이 바로 존 파
이퍼의 책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칼빈주의”(new Calvinism)의 개척자로 지목되는 분이 바로 존
파이퍼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는 “바울 신학의 새관점”과 관련하여 톰 라이트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파이퍼가
톰 라이트의 새관점을 반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소론”이라는 논문은 왜 오늘 우리 시대에 변증학이 점점 신학교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자 하는 관심으로 쓰여진 논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장하는 칼 바르트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바르트의 격렬한 비판자였던 코넬르우스 반틸의 전제주의 변
증도 마찬가지 함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증학은 저의 신학적 관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가르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대학원에 변증학 과목을 개설하였다가 대학에서 입학사
정관에 위촉이 되는 바람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분야임에 분명합니
다.
“여성의 사역과 여성 신학”이라는 논문은 백석대학교 교목 부총장이신 허광재 목사님의 고희 기념 논문집인 『여성이여
영원하라』에 수록되었던 논문입니다. 큰 맥락에서 여성 신학은 반대하지만 여성 안수를 포함하여 여성 사역에 대해서는
반대할 하등의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논문의 기본 논지입니다. 성경은 짐짓 여성을 차별하는 듯이 보
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성경 해석이라면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서로 찬반의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성 안수를 지지하면 마치 성경의 무오성이나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논문집의 세 번째 축인 영성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해 백석대학교로 옮기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성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이전 학교에서 “현대영성신학”이나 “성령론”과 같은 과목을 가르칠
계획까지 세워 놓았던 것을 보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제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선교단체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성경읽
기회(UBF)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백석대학교에서는 기독학생회(IVF) 지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백석대학교에 와서부터입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는 어찌 보면 도전적인 명제를 통해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즉 “신학이 학문이 아니
다”는 말은 신학이 학문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실천과 영성, 그
리고 경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신학에 생명력
을 불어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 교육: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의 문제”라는 논문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창립총회 때 발표한 논문
입니다. 학회를 창립하려 할 때 일부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닌데 왜 학회를 만들려 하느냐?”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이에 대
해 대답하는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학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썼다가 그것을 좀더 확대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
니다.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학문이 아닌가?”라는 소논문은 이후의 저의 여러 논문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영성’과 ‘신학’
의 관계에 대한 제임스 패커의 견해”라는 논문과 “서평: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글이 바로 그렇게 해
서 쓰여 졌으니까 세편의 논문이 그 소논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타난 과학기술과 종교”라는 글과 “기독교인은 재난을 어떻게 봐야 하나?”는 백석정신아카데미
개혁주의생명신학본부에서 발간하는 『신학으로 세상 읽기』에 기고하였던 글들입니다. 학문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가볍
게 쓴 시론(時論)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로 옮긴 후 저는 백석정신아카데미 개혁주의생명신학본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석정신아카데
미 총재이신 장종현 목사님 이하 여러 연구위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책을 흔쾌히 출판해주신 도서출판 대서의 장대윤 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길은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의 연속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이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
다. 만추의 계절, 저무는 석양, 유한한 인생으로 영원에 대한 감각을 어렴풋이나마 느껴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 119:96).
2010년 10월 27일 안서골 백석정신아카데미에서
목차
I.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 _7
01 개혁신학과 자연과학 _8
02 창조와 진화에 대한 몰트만의 견해 _42
03 자연과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맥그라스의 견해: _62
도킨스의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04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시도한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세 가지 견해 _90
II. 신학과 교회 _119
05 칼빈과 삼위일체론, 그리고 한국 교회 _120
06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천지창조의 목적 _155
07 존 파이퍼의 “기독교 희락주의”: _179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과 관련하여 _179
08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소론 _210
09 여성의 사역과 여성신학 _237
III. 영성과 현실 _261
10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신학 교육: _262
학문만으로서의 신학의 문제
11 ‘영성’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제임스 패커의 견해 _303
12 서평: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_327
13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타난 과학기술과 종교 _337
14 기독교인은 재난을 어떻게 봐야 하나? _344